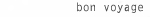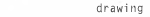풍경. 아버지와 딸이 앉아 있다. 아버지는 벌써 두 시간째 열변을 토하는 중이다. 딸의 얼굴은 회색을 넘어 먹색에 가까워 있다. 얼굴의 먹색은 그녀가 정신줄을 안드로메다로 보냈음을 의미한다. 초점을 잃은 눈은 공기의 사이를 둥둥 떠다닌다. 가끔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 시간이 가는 지도 모를 때도 있다. 주로 아버지의 지난 시절 이야기를 들을 때이다. 그럴 때 딸의 두 눈은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나 그런 호사를 누릴 기회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경상도 사나이답게 말을 아낀다. 그런 아버지가 딸에게 열변을 토하는 때는, 주로 그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 때이다. 주입의 '꺼리' 도 다양하기만 하다면야 나쁘지 않다. 문제는 그의 주입이 항상 컨트롤C+V라는 데에 있다.
「생각의 좌표」(홍세화, 한겨레출판, 2009)
홍세화의 오랜만에 나온 신작을 읽으면서 나는 아버지의 몇 시간 짜리 설교를 들을 때와 같은, '적당히 짜증 섞인 피곤함' 을 느꼈다. 차라리 아버지의 '박정희 예찬론' 을 듣는 것이 더 화끈하고 재미있겠다. 어쨌든 앞으로 홍세화의 책은 읽지 않을 거다.
1.
학문으로서 인문사회과학에 정답이 있을까? 난 아직 잘 모르겠다. 다만 '아니오' 라는 대답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될 뿐이다. 홍세화는 힘주어 '정답이 없음' 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의 예로 '사형제도' 를 들었다. 사형제도는 과연 폐지되어야 마땅한가? 앞서 인문사회과학의 문제들에 정답이 없다는 데에 동의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언하지 못해야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뿐. 그런데 그는 바로 뒷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학문으로서 인문사회과학에 정답이 있을까? 난 아직 잘 모르겠다. 다만 '아니오' 라는 대답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될 뿐이다. 홍세화는 힘주어 '정답이 없음' 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의 예로 '사형제도' 를 들었다. 사형제도는 과연 폐지되어야 마땅한가? 앞서 인문사회과학의 문제들에 정답이 없다는 데에 동의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언하지 못해야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뿐. 그런데 그는 바로 뒷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사람이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전쟁을 용인할 수 없듯이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사형제를 용인할 수 없다.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인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못하는 인간이성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전쟁에 경악하지 못하는 인간이성이다.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전쟁에 익숙해진 사람이기에 개인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일에 익숙한 것이다.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인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못하는 인간이성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전쟁에 경악하지 못하는 인간이성이다.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전쟁에 익숙해진 사람이기에 개인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일에 익숙한 것이다.
이런 악담을 듣고서도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할 '용자' 가 있을까?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전쟁을 용인하는 사람과 같다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현상에 무감해진 사람이라는데? 물론 나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공격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학교 다닐 때의 일이다. '공창제도' 에 대해 무서운 언니들과 토론을 하게 됐다. 무서운 언니는 내 말이 끝날 때마다 "그래서 너는, 사람의 몸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을 용인할 수 있다는 거니? 공창제도는 국가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용인하는 행위가 되는데?" 라고 쏘아붙인다. 언니의 고함에 기죽은 꼬꼬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토론은 벽에 부딪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다. '마약문제' 를 예로 들자.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마약을 합법화했다. 과연 마약이 용인할 만한 것이며 인간이 자신의 의식을 위험한 약물에 맡긴다는 것에 무감해져서일까? 'CCTV' 문제도 그렇다. 모르는 눈들이 나도 모르는 장소에서 나를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용인하며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데에 익숙해서 공공장소에의 CCTV설치를 찬성하나? '낙태 문제' 도 그렇다.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져야 하는 생명에 무감해서일까? '육식' 도 그렇다. 오늘날 육식을 하는 이들은 모두 거대 공장에서 생명으로서의 품위를 무시당한 채 사육되어지는 동물에 대해 무감해서일까?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것에 경악하지 못하는 인간이성이어서인 것일까?
'도덕적 근본주의자' 의 '똘레랑스' 는 너무나 우스꽝스럽다.
'도덕적 근본주의자' 의 '똘레랑스' 는 너무나 우스꽝스럽다.
2.
일상에서의 대중의 실천들에 대한 폄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거대 담론' 에 매몰되어 있는 그들은 '소비자 운동' 과 같은 작지만 의미있는 실천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인지, 현실 왜곡을 일삼기도 한다. 아래의 글을 보자.
그런데 한겨레나 경향신문 독자들까지도 그 일상을 지배하 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의식보다는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이 노동자가 아닌 소비자의 정체성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노사간 균형이 아직 먼얘기이듯,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독자들도 소비생활을 위한 제품을 구입할 때 삼성재벌의 반시민적, 반노동자적 행태를 감안하여 삼성을 보이콧하지는 않는다.
마지막 문장의 의미가 좀 모호하다. 삼성을 보이콧하긴 하는데 그것이 삼성의 반시민적, 반노동자적 행태의 감안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예 삼성을 보이콧하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사실 정확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명백한 사실왜곡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을 보이콧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정도였으면 수긍하고 넘어갈 만했을 것이다. 삼성 뿐 아니라 많은 악덕기업들을 보이콧해온 사람들에게 이런 발언은 짜증을 넘어 허탈함을 느끼게 한다.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왜 굳이 소비자로서의 정체성과 따로 떨어져 생각되어야 하는 지도 알 수 없다. 오늘의 사회에서 시민은 곧 소비자 아닌가? 한 인간에게서 정신착란 증세를 보고자 한다면 그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과 '소비자로서의 정체성' 외 각종 정체성(ex.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여자로서의 정체성, 루저로서의 정체성 등)을 분할하려고 시도해 보면 될 일이다. 어떤 정체성이 왜 다른 정체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인지는 시어머니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알면 다쳐.
3.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을 가르는 경계는 무엇일까? '인간적' 이라는 것과 '비인간적' 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쉽게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실제로 상당히 불분명한 것이다. '휴머니즘' 은 그래서 우스꽝스럽다. 비관과 혐오의 늪에 빠져 있는 진보주의자는 안쓰럽지만 늪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겠다고 허우적거리는(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인데), 그리하여 겨우 목만 늪의 위로 내놓은 채로 '나 빠져나왔소' 하는 진보주의자는 더 안쓰럽다.